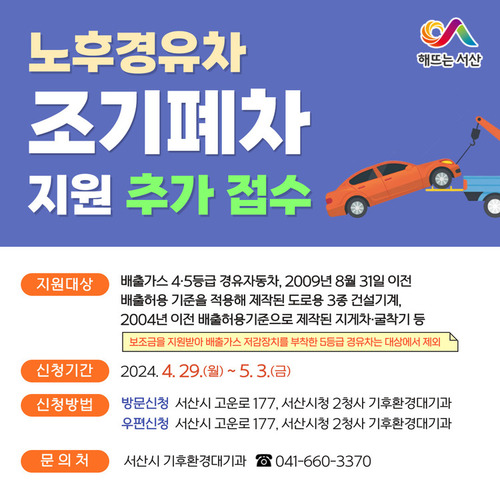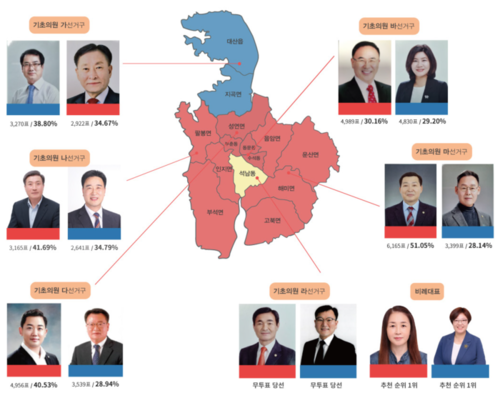이제 날씨가 풀려 봄기운이 성큼 다가왔다. 바람도 부드럽고 산과 들에는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곧 비가 내릴 듯이 짙은 회색 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늦은 점심시간 원도심 거리는 비교적 한산하다. 후배 기자와 점심 메뉴를 고민하던 중 오늘따라 미세먼지가 많아 목도 칼칼한 것이 얼큰한 칼국수에 한 표를 던졌다. 우리 신문사 근처에 30년 가까이 된 노포 ‘백제 분식’을 오랜만에 찾았다.
허름한 골목길을 돌아 5분쯤 걸었다. 넓은 주차장을 끼고 있는 아주 오래된 낡은 집이다. 지붕은 최근에 개조하고 보수한 흔적도 보인다. 시내 한복판에 이런 구조의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아마도 옛날에는 가정집이 아니었을까 싶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서자 올해 팔순을 맞는 사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쉬고 계신 중인데....ㅠㅠ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우선 칼국수 두 그릇을 주문했다.
구석구석 오래된 집기들은 그동안 치열했던 삶을 고스란히 세월의 나이테가 말해주고 있었다. 기둥과 문지방이 달아 반들반들 윤이 난다. 탁자 옆에 석유 난로는 레트로 감성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도 성냥 불을 켜서 심지에 불을 붙이다니 말이다. 서까래를 받치는 기둥이 있고 문턱이 높은 방을 보니 옛날 시골집 생각이 떠오른다.
그때 칼국수와 잘 어울리는 맛깔스러운 깍두기와 배추김치가 먼저 상에 올랐다. 적당히 익은 김장김치를 보자 입안에 군침이 돌며 갑자기 허기가 진다. 자꾸만 주방쪽으로 눈이 돌아간다. 염치불고(廉恥不顧)하고 우선 김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역시 묶은 김장김치의 아삭함이 식욕을 돋운다.
칼국수 면은 전날 밤에 밀가루 반죽을 직접 해서 동그랗게 밀어 냉장고에서 숙성시킨다고 하셨다. 꺼내서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시는 친절함?! 주방에는 양파, 무 등 신선한 야채와 함께 뽑아낸 멸치육수가 팔팔 끓고 있다. 쫄깃한 면을 썰어 투하하고 뚜껑을 덮자 탱글탱글 면발이 익어가며 구수한 냄새가 올라온다. 거기에 서산의 명물 굴과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바지락을 넣고 신선한 호박, 감자, 달걀을 풀고 한번 푹 끓인 다음 건져낸다. 마지막으로 바삭한 김 가루를 첨가하면 맛있는 칼국수가 완성되었다.
다리가 불편하신 사장님을 대신해서 서빙은 눈치껏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 식성에 따라 양념장을 넣으면 얼큰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다른 칼국숫집에 비해 요란할 것도 특별한 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해 보인다. 하지만 반평생 노하우 플러스 어머님의 정성과 손맛이 더해서인지 국물도 시원하고 담백하다. 오늘처럼 스산한 날씨에는 안성맞춤! 잘 선택한 것 같다. 특히 사이다를 넣은 것 같은 시원한 김치가 정점을 찍는다.
오늘 야외 취재를 다녀와서 몸이 얼었는지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콧물이 자꾸만 흐른다. 정신없이 반쯤 비우고 고개를 들어 큰 숨 한번 내쉬며 밖을 보니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산도 없는데.....하필이면?!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며 구옥의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제법 운치 있는 집이다. 이 대목에서 톡 쏘는 막걸리가 생각나는 지점이지만 아쉽게도 주류는 판매하지 않는다. 식사 때가 지난 시간이라 손님이 우리 둘밖에 없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건너편에 앉아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모습이 웬지 돌아가신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다.
원래 젊어서 남편이 시장에서 양복점을 운영하셨다고 했다. 사십 후반에 남편분이 일찍 하늘에 별이 되고 혼자 고민 끝에 국숫집을 열게 되었는데 상호는 남편이 하던 백제 양복점 이름을 따서 백제 분식이라고 지었다고 하셨다. 평소 김치를 잘 담그기로 유명해 지인들 부탁으로 김치를 담아 조금씩 팔기도 할 정도로 솜씨를 인정받았다고 은근히 자랑도 하셨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김치가 맛있어 국수 장사를 하면 잘할 것 같다고 했단다. 그렇게 시작해 올해로 팔순을 맞았으니 반평생을 열 평 남짓한 이곳을 지키며 보낸 셈이다.
칼국수를 얼마나 후하게 주셨는지 이야기 들으며 내내 먹었지만 바닦이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배는 부른데 서비스로 만두까지 두 개 넣어 꾹꾹 눌러주신 어머니 같은 마음과 정성을 생각해 차마 남길 수가 없었다. 후배는 눈치 없이 선심 쓰며 만두를 내게 건져준다. 그래! “다 먹고 오늘 저녁은 굶자”라고 생각했다.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한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올라오는 흙냄새를 맡으며 그 옛날 고향 집 앞마당을 추억해본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나는 특별한 외식을 모르고 자랐다. 밭둑에 애호박이 열리면 어머니는 수제비를 뜨거나 칼국수를 만들어 애호박 고명을 얹어 먹던 게 전부였다. 면을 좋아했던 나는 어머니가 밀가루를 반죽하면 일찍부터 부뚜막에 앉아 지켜보며 잔심부름을 하곤 했다. 아직도 구수한 그 맛과 냄새를 기억한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동안 도란도란 자식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고 큰딸은 어려서 공부도 제법 잘했다고 했다. 나중에 나처럼 양복쟁이 만나지 말고 배워서 시집 잘 가라고 어려서 주산학원도 보내 주었고 그 덕에 여상에 진학해 좋은 회사에 스카웃 되었다며....ㅎㅎ 부모 마음은 다 같은가 보다. 그 모습이 참 귀여우셨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용돈도 많이 주신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내리던 비가 잠시 누그러졌다. 거리가 촉촉하게 젖었다. 다음 주면 목장길 벚나무에 꽃망울이 피겠지 싶다.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한참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작권자 ⓒ 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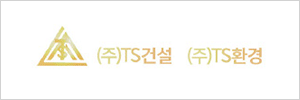



4383.png)